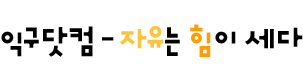1. 연개소문 평가의 어려움
얼마 전 종영된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은 연개소문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했다. 비록 단면적 시각을 많이 노출하기는 했지만 MBC 드라마 <신돈>에 이어 문제적 인물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무척 엇갈린다. 민족의 자주성을 드높인 영웅이라는 찬사가 있는가 하면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망국을 가져다 온 독재자라는 견해가 버성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그가 한국사에서 품었던 이상이 빼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드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연개소문이 사망할 때까지 당나라는 고구려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연개소문의 사망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665년에서 666년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연개소문은 수나라군보다 더 강성해진 당나라군을 상대로 노대국(老大國)의 자존심을 지켰다. 고구려의 패망에 당시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의 책임이 적잖다는 판단은 적절하지만, 을지문덕이나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쏟아지는 경애에 견주어 연개소문은 상대적으로 폄하된 감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이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로 그려져 있지만 그 편찬자들이 사용했던 거의 모든 사료는 『자치통감』, 『북사』, 『수서』, 『구당서』, 『신당서』 등 중국 측 자료였다. 연개소문에 번번이 패한 중국인들의 증오에 찬 묘사를 그대로 끌어다 쓴 건 김부식을 위시한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나태다. 설령 자료가 부족해 불가항력적이라고 해도 비판적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 다만 김부식도 그게 좀 너무했다 싶었는지 “비록 끝내는 스스로 탈출해 나왔으나 두려워함이 그와 같았는데 『신당서』, 『구당서』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에는 이 일을 말하지 않으니 어찌 자기 나라를 위해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雖終於自脫, 而危懼如彼, 而新舊書及通鑑, 不言者, 豈非爲國諱之者乎)”라고 논하며 중국측 기록을 의심한다. 그러나 김부식은 “소문은 일신을 보전해 집에서 죽었으니 요행으로 모면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라며 연개소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다. 『삼국유사』는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진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도드라지게 서술되기도 했다.
『동국통감』에서 권근은 더 엄격한 유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부식이 송나라 왕안석은 연개소문이 비상한 인물이었다는 평을 인용한 것을 비판한다. 난적의 괴수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하고금에 난신적자가 누구인들 비상인(非常人)이 아니겠습니까(天下古今亂臣賊子孰非非常之人乎)”라며 언짢아한다. 조선 후기까지 대부분의 사서에서 연개소문은 강상(綱常)의 도리를 어지럽힌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고 중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원죄는 충성과 사대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호되게 겪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고구려의 강대한 군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연개소문에 대한 호의적 반응도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구려가 강성함만 믿고 수당과 전쟁을 벌였다는 인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런 맥락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악감정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이후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연개소문이 재평가된다. 신채호 선생은 “우리 4천 년 역사에서 첫째로 꼽을 만한 영웅”이라 하였고, 박은식 선생은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제1인자”, 문일평 선생은 “천고의 영걸(英傑)”이라고 평했다. 특히 신채호 선생은 “호족공화제(豪族共和制)라는 구제도를 타파하고 정권을 통일”했으며 “서수남진(西守南進) 정책을 변경하여 남수서진(南守西進) 정책을 세웠으며” “당 태종을 격파하여 중국 대륙 침략을 시도”했다는 진취적 기상을 기렸다. 일제 강점기기의 이런 변화는 독립심을 고취하기 위해 외세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 부각이다. 시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의 평이 이렇게 나뉜다. 역사의 재해석은 우리가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경계로 삼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다.
오늘날도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다채롭다. 다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심리가 다소 작용한 탓인지 이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좀 더 늘은 듯싶다.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저도 어렵다. 인간은 불완전할뿐더러 변화의 궤적을 더듬기도 힘들지만 다면적인 인간의 속살을 헤집기 위해서는 선입견도 다독여야 한다. 단재는 『조선상고사』에서 “시국의 형편이 연개소문을 낳음이요, 연개소문이 시국의 형편을 낳음이 아니다”고 말한다. “고대에 이른바 영웅·위인들이 거의 시국의 형편이 낳은 창조물이요 그 자체의 위대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어쩌면 인간이 당대의 현실 제약에서 밀고 당기듯이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풀이도 당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취사선택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서거정은 <삼국사 읽다讀三國史>는 시에서 수와 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겼던 삼국의 인물들을 향해 “반은 영웅이요 반은 흉역이다(半是英雄半兇逆)”라는 탄식을 남겼다. 나도 이 양다리에 동참하고 싶어진다.^^;
2. 고-당 대전의 전개와 고구려의 길
연개소문 정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외교정책이다. 연개소문의 대외 강경책이 고구려의 패망을 앞당겼다는 주장이 적잖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598년 영양태왕이 요서 지역을 선공(先攻)한 것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수나라와의 4차 전쟁이 당나라와의 대결에서 허점을 노출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승리 속에서 패망의 요소를 배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 태종 이세민은 황제천가한(皇帝天可汗)을 자임하며 한족과 유목민족 두 세계의 최고 지배자임을 지향했다. 대당 온건책을 구사했던 영류태왕 집권 시절인 631년에 당나라는 고구려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경관(京觀)을 허물고, 641년 사신 진대덕을 통해 고구려 지리를 염탐한다. 이세민은 여건이 구비되면 고구려로 향할 뜻을 여러 번 천명하고 있다. 연개소문이 전쟁을 좀 피하려는 시도를 했더라도 얼마나 통했을지 회의적이다. 가령 1차 고-당 전쟁에서 승리한 645년 이후 고구려는 당나라의 후속 침입을 방어하면서도 646년, 647년, 648년, 652년, 656년에 계속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시성 전투로 유명한 1차 고-당 전쟁에서 『자치통감』, 『신당서』 등에서는 당군의 피해가 2,000명 남짓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군 전사자가 4만 명이라고 할 때 압도적인 승리인 셈이다. 그런데도 당 태종 이세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그는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현무문의 변 등의 기록을 직접 보고 고치게 했던 만큼 역사 왜곡의 전과가 있다. 자신이 직접 참전한 전쟁의 기록을 윤색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하기야 대개의 중국 기록이 늘 그런 식이다. 타국에게 패전할 때 추위와 역병으로 둘러대기 일쑤다. 중국의 사료를 볼 때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승자의 기록으로 패자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나태한 발상이다. 중국측 사료에 갇히는 건 좀 과장해서 제국주의를 은연중에 용납하고, 식민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 섬세한 문헌비판이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의 경극과 희곡에서 연개소문이 이세민 일당을 패주시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비록 악역으로 비하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왜곡하기는 해도 말이다).
660년 당나라는 백제를 거꾸러뜨린 여세를 몰아 재차 고구려를 침공한다. 2차 고-당 전쟁에서 당군은 고구려의 견고한 요동 방어망 대신 서해를 건너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직접 향하는 새로운 공격로를 개척했다. 백제 멸망으로 고구려를 도울 수 있는 우방국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도리어 백제 부흥을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했으므로 고구려에게 부담이 되었을 뿐이다. 반면 당은 더 강력해진 신라를 병참기지 및 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662년 연개소문이 평양성 근처 사수(蛇水)에서 옥저도총관 방효태와 그 아들 13명을 포함한 당군 전원을 궤멸시킨 것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하다. 안시성 전투 못지 않은 사수대첩의 중국측 기록이 소략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패배가 심대했음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 평양을 포위하던 소정방은 신라군이 제공한 양식에 힘입어 꽁무니를 뺐다고 전한다. 소정방군이 큰 눈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연개소문 사후 용렬한 자식들의 권력 분쟁으로 촉발된 3차 고-당 전쟁으로 고구려는 막을 내렸다. 이세민이 630년 동돌궐을 이긴 때부터 670년 설인귀 휘하의 당군 10만이 대패할 때까지 40년 간 당나라의 국세는 전성기였다고 평가된다. 690년 성신황제(聖神皇帝)에 오른 측천무후 집권 초기만 잘 넘겼다면 고구려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봄직 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얼마나 부질없는가. 고구려라고 당나라의 연전(連戰)을 희망해서 치른 것을 아닐 게다. 중국 중심의 일원적 천하관을 실현하려는 당나라의 침략 야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고구려 망국 30년만인 698년 발해가 건국된 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켜도 그 땅을 온전히 지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고-수, 고-당 대전을 배울 때 수나라와 당나라의 명백한 침략 야욕을 규탄하는 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고구려 말기의 사적을 돌아보며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는 둥의 볼멘 소리가 아쉬워서 해본 소리다. 누가 평화를 파괴한 약탈자인지는 또렷하다.
연개소문 정권에 대한 단행본을 낸 김용만 교수는 고구려와 신라와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름에 주목했다. “동아시아 최대의 문명전쟁에서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 것”이며, “고구려는 당나라를 물리치는 것으로써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언명은 그간의 고정관념을 흔든다. 중국 중심의 일원적 세계관과 고구려 독자노선의 다원적 세계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연 고구려의 입장에서 신라와 같은 친당 외교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했을지 헤집다 보면 이 혈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고구려는 김춘추의 길을 걷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연개소문의 길을 유지하기 위한 조율에 실패해서 망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연개소문이 고구려가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걸었던 것이지만.
3. 연개소문 정권의 한계
나는 연개소문 정권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귀족연립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적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치중했다. 시스템의 개편에 집중하지 않고 1인 개혁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사후에 불거질 혼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없었다. 연개소문의 대내 정책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도교진흥책 정도를 들 수 있겠다. 도교의 수입은 대당 유화책의 대표 사례라고 보기도 하고, 반체제, 반문화적 이념을 독재정치에 이용했다는 설도 있고, 불교계의 반발을 사서 지식인들의 분열을 유발했다고 평하기도 한다. 별다른 자료가 없는 판국에 연개소문의 비전이나 철학을 읽었다고 한다면 억지일 게다. 그러나 특별한 대내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연개소문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허비한 공력을 대강 짐작해볼 수 있다. 현상 유지에 안주하기에는 당시 국제정세는 너무 격동적이었다.
『일본서기』에는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세 아들을 불러 “너희들은 고기와 물과 같이 서로 화목하여 작위를 다투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웃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유언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유언 자체는 멋진 말이지만 가족의 집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엿볼 수도 있다. 그 또한 전근대 사회의 지도자의 보편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들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수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권력을 세습하게 했으며, 태막리지(太莫離支), 태대대로(太大對盧) 등 집권을 위한 관직을 새로 만들어 취임하는 등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추종 세력의 발판을 넓히지 못하고 귀족세력의 반발을 유발했다. 연개소문 사후에 벌어진 자식들 사이의 골육상쟁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지한 리더십이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연개소문은 자신이 그토록 지켜내려 애썼던 고구려의 존속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취약한 정통성이 끝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의 침입에 맞선 것이 결국 정권 연장의 수단이라고 평가절하 됨도 이 때문이다.
연개소문은 분명 장군으로서의 자질이 출중했고, 당나라의 패권주의에 맞서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란족에 대한 영향력 다툼에서 당나라에 패배하고, 당을 견제할 동맹국 설연타의 멸망을 지켜봤으며, 백제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백제 부흥 운동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차츰차츰 불리해지는 국제 정세를 획기적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아울러 연개소문은 고-수 전쟁과 1차 고-당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준 요동 방어망을 과신하다 당나라의 백제 침공이라는 묘수에 결정타를 당했다. 고구려의 관성이 당나라의 혁신을 이겨내지 못했다. 일목난지(一木難支)라고 했다. 고구려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연개소문의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나친 처사다. 최고 권력자들의 다툼이 아무리 심했던들 연개소문 사후 3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것은 70년에 걸친 전란으로 말미암은 고구려의 내상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연개소문의 결정적 실책으로 신라와 척을 진 것을 많이들 꼽는다. 신라와 백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다면 해상 방어망에 유리한 백제를 선택한 것은 크게 그릇된 판단은 아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신라측 인물의 전사자 대부분이 백제와의 전투 중에 죽은 것을 볼 때 백제와 신라의 극한 대립은 연개소문이 양자택일을 해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추론하게 만든다. 연개소문이 신라와 백제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는 않았다. 문제는 동맹의 견고성이었다. 동맹국인 백제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고구려의 대응이 너무 없었음을 비추어 볼 때 신라와 당과 같은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삼국에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위를 들이대는 건 무모한 일이라는 건 상식이 된 듯싶다. 그렇다고 쳐도 어느 정도 존재했을 삼국의 동류의식은 어떤 형국이었을까. 연개소문이 고뇌했던 삼국의 대립상은 외부의 강적에 대한 견제와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나당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연개소문의 한계는 이런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적어도 삼국 통합의 의지까지 품지는 못했던 듯싶다.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정권 연장에만 급급했던 고려 최씨 무인정권을 반추해봐도 연개소문의 처신은 보아줄 만한 것이 많다. 비록 왜와 청의 침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위정자들이 보여준 태도를 곱씹어봐도 그렇다. 선조는 여차하면 명으로 도망갈 궁리를 했으며, 인조는 굴욕적 항복을 할 때까지 무책임했다. 연개소문 부자는 전장터를 누볐다. 둘째 아들 연남건은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나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있어 고구려의 최후가 부끄럽지 않았다. 물론 연개소문가에는 당에 협력한 매국노 연남생이나 신라로 재빨리 투항한 연정토 같이 변변치 못한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후까지 평양성을 사수하며 고구려 패망에 책임을 진 거의 유일한 지도층이었던 연남건의 존재는 연개소문 정권의 의연함을 상징한다. 설령 권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제 자리를 늦게까지 지켰던 사람에게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건 막을 길이 없다.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바이런의 말을 되뇌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고구려사를 그리워할 때 연남건의 이름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4. 고구려 패망과 삼국통일의 의의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가 차지한 무게감 때문에 고구려의 패망을 돌아봄은 아쉬움이다. 신라가 생존을 위해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면 고구려는 다원화된 천하의 한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다원화라는 말을 쓰는 건 조심스럽다. 고구려가 국제정치 상의 다원주의라든가 다극화 수준까지 꾀한 것은 아니다. 자국 중심의 일원적 천하관을 둘레에 강요한 서토(西土)의 무리들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독점적 천하관 대 과점적 천하관으로 구분해볼 수도 있겠다. 조중동의 언로 과점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이 세 신문이 하나였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고구려의 과점적 천하관은 오십보 백보이기는 해도 중국의 독점적 천하관보다 좀 더 진일보한 면이 있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중화문명의 독주를 막을 세력이 없어졌다. 중국은 이후 줄곧 지배세력만 교체된 채 문화적 우위를 독점했다.
고구려의 소멸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패권주의를 강화시켰다.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이 감퇴된 측면에 앞서 우리에게 뼈아픈 것은 고구려 문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소중화(小中華)라는 기형적인 자부심이 아닌 당당한 문명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유구한 역사에서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다. 고구려가 졌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고구려의 패배를 새로운 전기로 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라도 치밀한 기록을 남기는 국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꼼꼼한 기록을 남기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 치밀한 기록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책임성을 높여줄 것이다. 당파성에 함몰되지 않고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남기는 현대판 사관은 불가능한 꿈일까. 이세민이 성군의 표상으로 과대 포장되고 연개소문이 악마성의 표지로 전락한 것은 결국 기록의 차이다. 기록은 국력이다.
역사는 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신라의 대안이 더 현실 적합성이 높았는지 모른다. 중화문명은 그만큼 대단하고 막강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인 선택이다. 역사는 결과의 학문이라고 하지만 성과만을 찬양하며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리라. 그렇다고 신라의 외세 이용을 반민족적 망동으로 치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589년 수 문제 양견이 서토를 통일하고 오랜 분열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던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분열보다는 통합을 강요받게 되었다. 비록 그 통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나쁜 쪽으로 귀결되었기는 해도 통합은 당대의 핵심과제라 판단된다. 통합 국면을 적극적으로 대응한 신라의 정성을 부러 외면하기는 힘들다. 다만 오늘날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평화적인 방법뿐임을 역사는 가르쳐 준다.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는 북한이 자주적 통일을 주창하는 게 허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외세의 개입을 줄이고 싶다면 평화통일의 길밖에 없다. 신라의 백제, 고구려 병탄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막심했다. 이제 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21세기의 통일은 신라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걸어서도 안 된다.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를 정통으로 삼아 단군조선 -> 고구려 -> 고려 -> 북한으로 이어지는 도식을 도출해낸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며 의도한 편식이다. 앞으로 남북 간 한국사 학술 교류를 통해 인식의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한다.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남한이 고구려와 발해를 잘 모르듯이, 북한도 신라와 백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더 잘 알게 된다면 편향성을 다독이고 삼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바라볼 안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3월 신축 기사에서 이조판서 허조는 “우리 왕조의 전장(典章)과 문물은 신라의 제도를 증감(增減)하였으니, 다만 신라 시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한다. 세종대왕은 “삼국이 정립 대치하여 서로 막상막하였으니, 이것을 버리고 저것만 취할 수는 없다(三國鼎峙, 不相上下, 不可捨此而取彼也)”며 거부한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재해석되기 마련이지만 그 출발점은 팩트의 보존이다.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모두 우리의 선조이며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에 반대한답시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언젠가 중국에 흡수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한때 서토를 호령하던 북방 유목민족 가운데 오늘날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몽골뿐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통일로 말미암은 중국화의 증거는 명백하지만 고구려 통일로 발생할 중국화의 심화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국가의 미덕은 생존이라는 명제는 거개 맞지만 고구려가 생존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하물며 고구려가 생존에 성공했다고 해도 결과는 더 파국적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패배주의적 사고다. 그것은 냉정한 성찰도 아니고, 객관적인 관찰도 아니다.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제약조건 속에서 고구려의 독자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모욕하는 태도는 또 하나의 극단이다.
5. 연개소문과 고구려를 기억하기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천년의 역사는 ‘중국화’의 길을 걸어왔다며 “우리가 ‘중국화의 길’을 선택한 계기는 7세기 후반 8세기 초 삼국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힘에 압도당한 체험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갔다’면 비판적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그 시절에 한민족 생존의 가장 현명하고 실질적 방법은 중국화의 길 외에 무엇이 가능했겠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신라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 단지 하나 밖에 없었던 것인가. 고구려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만 허락된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다. 중국이 문치를 상징하고, 고구려가 무치를 상징한다는 이분법도 사실과 다를 공산이 크다. 중국화 아니면 소멸이라는 도식은 끝끝내 인정하기 힘들다. 적어도 김춘추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연개소문에게는 맞지 않는다. 화이관(華夷觀)을 연상시키는 이 전 위원장의 한국사 이해는 단선적이고 체념적이다.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북방 유목민족들이 하나둘 중국화(中國化)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아름다운 예외였다. 거의 모든 지배계급이 중국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도 끝내 중국과는 별개의 주체성을 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롭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중국의 힘이 오늘날 미국보다 더 규정력이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일정 부분 건사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 개방성이라는 요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개방성이 반드시 독창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층의 중국화 열망을 막아낸 것은 힘없는 백성의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는 고구려에 대한 기억이 켜켜이 쌓인 덕분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나는 이런 견해가 진실을 조작하는 것도 아니며, 전복적 상상력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구려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 타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구려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큰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고구려의 집단기억은 우리네 살림살이에 각인되었고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전에 백낙청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라고 언급했다.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민주화세력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신선하다. 산업화세력의 경제발전 방식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살린 민주화세력이 크게 공헌했다는 견해에 상당 부분 동감한다. 실상 박정희의 절제를 기대하는 것보다 민주화세력의 견제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음을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고구려 말기와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도 이런 균형감각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연개소문은 한국사에서 값진 경험을 남김으로써 한민족의 영속과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나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전쟁을 치르기 위해 연개소문을 부각시키는 것도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본다. 편의적인 이용이라고 핀잔할 수도 있겠다. 동북아 역사전쟁에 초연한 것을 상생의 손짓인양 생각하는 분들은 노예의 도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예의 도덕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대범하다거나 겸허하다는 걸로 포장한다(하기야 이 노예의 도덕은 국수주의나 군사주의에게도 넉넉하기 일쑤다). 역사전쟁은 거칠게 표현해 제국주의와 평화주의의 싸움이다. 공세적인 방어로 평화의 기치를 들자. 현대 국민국가의 국경 개념이나 민족 개념을 고대 국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도 들리지만 유치한 땅따먹기를 시작한 쪽은 중국이다. 이 와중에 국사 해체론 같은 현실도피적 청담(淸談)이나 늘어놓는 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허구한 날 긴장하며 경계근무를 해야했던 고구려 병사의 심정을, 배곯이에 시달리는 고구려 아이의 마음을 추체험하며 헝클어졌던 그 시대 개별 인간의 삶을 헛되다고,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는 좀 차렸으면 좋겠다.
역사는 결국 미래를 지향한다. 연개소문 시대를 도두보는 건 거기서 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다. 세계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21세기가 다중심성의 사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마도 이런 이상적 의미의 세계화는 도래하지 않을 거 같다.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화 혹은 서구화라는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복수 문명권이 협력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개소문이 미처 이루지 못했고, 고구려가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늘날 이 땅에서 도전해보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고안해낸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요설이 아니다. 특수성을 뽐내면서도 보편성을 잃지 않는 한국적 가치관의 모색은 편협한 민족주의로 가두기에는 그 품이 너르다. 앞서 강조했듯이 고구려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과업은 한국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튼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개소문을 기억하는 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매운 의지를 벼리는 일이다. 아마도 외부의 싸움만큼이나 내부의 싸움이 지난할 것이다. - [無棄]
<참고 문헌>
이 글에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고 영감을 얻은 자료들도 모아봤습니다. 단행본밖에 모르던 제가 학교 도서관 학회지 논문 검색과 연속간행물 서고 등을 거닐며 모은 자료라 개인적으로 각별해서 기록했어요. 졸문 작성에 특히 많은 도움을 받은 자료에는 별표(*)를 했습니다.
<단행본>
김기흥, 『새롭게 쓴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1993
*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9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출판사, 1999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의 정치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서병국, 『고구려제국사』, 혜안, 1997
신채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문화사(외)』, 비봉출판사, 2007
신채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06
여호규 외,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 푸른역사, 1999
이덕일, 『고구려 700년의 수수께끼』, 대산출판사, 2000
* 이성무, 『한국역사의 이해 3』, 집문당, 2001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논문자료>
* 강봉룡, “김유신 -사대주의자인가 통일공신인가”, 『역사비평』 제24호,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1993, pp. 209~214
*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의 비교 연구 : 그 전개과정 및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0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p. 101~122
* 고영진, “한국사 속의 세계화, 주체성 그리고 개혁”, 『역사와현실』 제37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pp. 47~73
* 김기흥,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 『서암조항래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서암조항래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pp. 15~34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2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pp. 23~38
김수태, “百濟의 滅亡과 唐”, 『백제연구』 제2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1, pp. 149~176
김영하, “김춘추, 외교로 준비된 왕”, 『내일을 여는 역사』 제9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pp. 14~26
* 김영하, “고구려의 멸망원인, 내분인가 외침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5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pp. 121~129
* 김영하, “영욕으로 얼룩진, 비범한 고구려인의 초상 연개소문”, 『내일을 여는 역사』 제3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pp. 139~148
김영하, “신라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 1993년 봄호(통권 22호),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1993, pp. 183~190
김영하,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민족문화연구』 제1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pp. 131~161
김주성,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고구려연구』 제20집, 고구려연구회, 2005, pp. 193~207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제105권, 한국사연구회, 1999, pp. 3~40
* 노태돈, “연개소문 - 무모한 대외강경론자, 포악한 권력자”, 『한국사시민강좌』 제31집, 일조각, 2002, pp. 1~22
* 노태돈, “淵蓋蘇文과 金春秋”, 『한국사 시민강좌』 제5집, 일조각, 1989, pp. 14~38
노태돈,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한국사론』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pp. 31~66
박경철, “麗唐戰爭의 再認識”, 『동북아역사논총』 제15호, 동북아역사재단, 2007, pp. 137~199
박형표, “淵蓋蘇文의 西征國策과 對唐 戰役”, 『건국학술지』 제10집,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69, pp. 15~34
변태섭,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한국사 시민강좌』 제5집, 일조각, 1989, pp. 1~13
신완순, “당태종과 연개소문 - 단순 ‘맞짱’ 아닌 ‘승리’를 일군 고구려의 위용”, 『통일한국』 제28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7, pp. 100~103
신형식, “[說林]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신라통일의 의미”, 『신라문화』 제2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pp. 237~243
신형식, “新羅 三國統一의 歷史的 意味”, 『선사와 고대』 제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pp. 3~12
신형식, “三國統一의 歷史的 性格”, 『한국사연구』 제61-62권, 한국사연구회, 1988, pp. 67~87
윤명철, “ 高句麗와 隋·唐戰爭의 性格에 關한 解析”, 『고구려연구』 제18집, 고구려연구회, 2004, pp. 811~836
이강래, “한·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15호, 동북아역사재단, 2007, pp. 201~271
이강래,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에 대한 북한 역사학의 이해 방식”,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pp. 16~30
이기동, “수(隋),당(唐)의 제국주의와 신라 외교의 묘체(妙諦)”, 『신라문화』 제2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pp. 7~22
이내옥,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敎”, 『역사학보』 제99-100집, 역사학회, 1983, pp. 67~103
이상원, “천개소문전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8.9합집, 한국문학회, 1986, pp. 215~233
이도학, “삼국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 정체성”, 『고구려연구』 제18집, 고구려연구회, 2004, pp. 533~558
* 이호영, “高句麗 敗亡原因論”,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 上』,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pp. 15~34
이호영, “新羅 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 『사학지』 제15권, 단국사학회, 1981, pp. 1~37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제31권, 한국고대사학회, 2003, pp. 5~33
임기환, “6ㆍ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제5권, 한국고대사학회, 1992, pp. 5~55
* 전미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上』,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94, pp. 267~287
정진헌, “조선 시대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연구』 제18집, 고구려연구회, 2004, pp. 591~620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현실』 제37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pp. 74~98
한명기, “조선시대 韓中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한국문화』 제3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pp. 337~366
허태용, “임진왜란의 경험과 고구려사 인식의 강화”, 『역사학보』 제190집, 역사학회, 2006, pp. 33~60